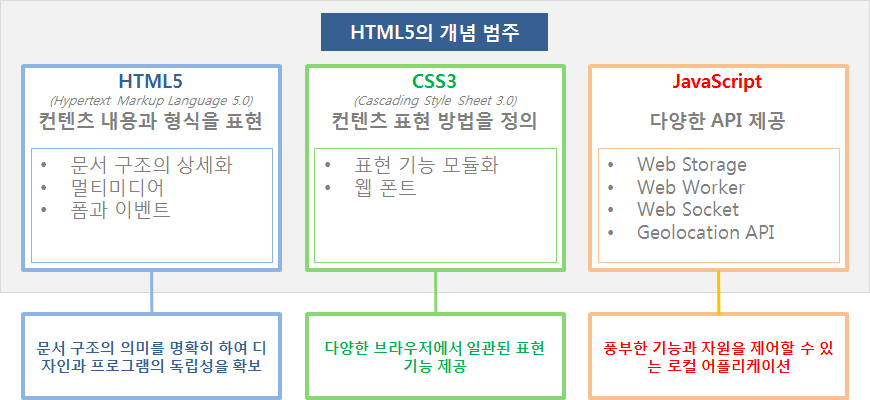케이블TV는 1995년 국내 도입된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1)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우며 뉴미디어의 핵심매체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지역생활 정보와 지방 의회 소식 등을 전하며 특화된 지역 미디어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케이블 방송은 HFC(Hybrid Fiber Coaxial) 망 구축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HFC는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을 혼합한 선로 기술을 뜻하며,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국으로부터 사용자 가까이에 있는 광단국(ONU)까지는 광케이블을 사용하고, 광단국으로부터 개별 가입자 단말까지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 HFC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개 채널 당 6MHZ를 할당하고, 256QAM의 경우 전송채널을 통하여 약 38Mbps로 하향전송이 가능합니다.
HFC의 장점으로는 동축케이블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점과 더 높은 신뢰도를 갖는 다는 점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접속과정이 필요 없이 인터넷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HFC의 장점입니다. 더불어 Cell별 독립된 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증가 및 서비스 구역 추가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망의 운용이 편리하다는 강력한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HFC는 속도 불안정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Cell로 전송된 인터넷 신호를 해당 지역 가입자가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입자 수가 늘어날수록 속도가 저하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Cell구성 혹은 Cell분할을 시도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몰려 트랙픽량이 많아지는 경우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기는 힘들며, 동축 구간의 옥외설치에 따른 환경적 변수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HFC 기술 고도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Cell분할을 통한 전송대역폭 확장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Cell 당 가입자 수를 감소시켜 잡음을 없애고 가입자당 대역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스위치드 디지털 비디오(SDV; Switched Digital Video)란 기술로 주파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특정 채널을 선택할 때마다 그 채널에 해당되는 방송 데이터만을 실제로 송출해주는 선택형 송출기술로 현재 주파수 대역폭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전송 메커니즘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SK브로드밴드에서 세계 최초로 HFC망의 IPTV 서비스에 이를 적용하여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주파수의 추가 확보 없이 UHD급 채널 수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케이블 사업자들은 유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힘쓰는 반면, 미국의 케이블 사업자들은 유무선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 대형 케이블업체 5개사가 협력하여 미국 내 ‘CableWIFi’네트워크를 구축하여 WiFi존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이동통신망 구축, MVNO, 그리고 WiFi 이 세가지 전략 중에 자체 이동통신망 구축을 포기하고 MVNO와 WiFi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각각의 개별 케이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많은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모으고,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N스크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편, 국내 케이블 시장도 방송망 구조의 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가입자의 댁내까지 광 구간을 연결하는 FTTH(Fiber-to-the-Home) 기반 All-Optic 구조뿐만 아니라, Fiber Deeper, HFC/UTP 혼합 등 다양한 망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RF/IP 융합 전송 구조로 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RF기반 방송 스트림과 IP기반 데이터 스트림을 융합하여 단일 복합 전송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하는 형태로 양방향 미디어 혹은 IP망 접속에 기반하는 스마트 방송 서비스를 케이블 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단말 기반, 헤드엔드 기반, 가입자 근접형 기반 3가지 방식이 있고 최근에는 마지막 200~300m이내 동축 구간에서 케이블 융합 전송을 하고자 하는 가입자 근접형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10G 케이블 방송망으로의 진화입니다. 하향 10Gbps, 상향 1Gbps로 전송이 가능한 고품질, 양방향 방송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로써 기존에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주파수나 전송 장비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공했던 것과 달리, 10G 전송 인프라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의 방송망입니다. 기존 5 ~ 864MHz였던 전송 대역은 5 ~ 1700MHz로 증가하고 최대 전송 가능 방송 콘텐츠 속도 또한 38.8Mbps에서 10Gbps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10G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모든 서비스가 IP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케이블 All-IP서비스 구조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을 감수하며 자체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 보다 기존 유선네트워크 망으로 갖는 강점에 더불어 점차적인 기술혁신으로 케이블 All-IP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사업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인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지역별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 사업자는 IPTV 혹은 OTT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소비자를 잡고 새로운 소비층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광대역 고효율 전송 기술에 집중하여 로열티 높은 유저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1)종합유선방송법 개정(1998.12) – 전송망사업 중단 및 경기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합유성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유제한, 겸영제한(유선방송국, PP, 전송망사업자간 상호겸영)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자체 전송선로 시설 설치를 허용.